
The moving truck rumbled down the narrow street and stopped between two identical brick buildings. Morning sunlight caught on the windows, scattering gold squares over the cracked asphalt of the Dawon Apartment courtyard. Laundry lines swayed from balcony to balcony, bright shirts fluttering like prayer flags. Somewhere a radio played an old trot song; the melody drifted through the open stairwell, joined by the faint whir of a blender and the scolding of a cat.
Honey stepped out of the truck, tying her hair into a loose knot. The air smelled of yeast and sesame oil, warm and familiar. She’d moved more times than she could count since coming to Korea seven years ago—tiny officetels, windowless studios, one shared flat with a fridge that hummed louder than her thoughts—but this one already felt different. She could see the sky here, not just the gray wall of another building.
Looking around, she was brought back to her first time moving to Korea. It was raining, she was alone, and the apartment looked oddly reminiscent to Harry Potter’s under-the-stairs room. Nothing about it screamed warmth or comfort and having just moved away from home it was something she craved. So, over the past seven years she did everything she could to cultivate her dream apartment.
The shouting of something in Korean pulled Honey from her thoughts. She looked over at the driver who was waiting expectedly next to her.
“I’m sorry, what was that?” She had asked.
“Where to?” He asked, presumably again.
Honey pointed toward the staircase marked B 동 2층. “That one, please. Second floor.” Her Korean was smooth, light with a trace of foreign rhythm. The man nodded, suddenly impressed.
As boxes thudded against the concrete, neighbors began to appear the way they always do when something new disturbs routine—first a curtain twitch, then a door creak. Honey pretended not to notice. She had learned long ago that curiosity was the unofficial language of every neighborhood.
It already smells like people live here, she thought, smiling. That’s a good sign.
The first to approach was a small woman in a floral apron carrying a tray of round buns dusted with flour.
“새로 이사오셨죠? Welcome, welcome!” she said, eyes bright. “I’m Park Sun-hee, A-동 1층. You can call me Mrs. Park. Bread for energy!”
Honey bowed politely. “감사합니다! Smells amazing.”
Mrs. Park beamed, pushing a bun into her hand. “You speak well!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Almost seven years.”
“Ah ~ then you’re practically local.” She laughed, clearly pleased, and added in a conspiratorial whisper, “But be careful. The man in B-1 is Mr. Choi—our self-appointed security guard. He’ll check if your trash is sorted properly.”
Honey laughed with her mouth full of sweet red bean. “I’ll do my best.”
While they talked, a tall older man in a navy vest emerged from the stairwell, carrying a wrench as if it were an extension of his arm.
“Mrs. Park, stop frightening the new tenant,” he grumbled, though his tone held no heat. He looked at Honey. “You’re in B-2?”
“Yes, sir.”
“I’ll fix your doorbell later. It rings twice for no reason.” He nodded once, curt but not unkind.
“Thank you,” Honey said. “And I’m Honey Hartt.”
“Mr. Choi.” He turned to go, muttering something about deliveries blocking his path.
Mrs. Park called after him, “See? Good man, just gruff!” then leaned toward Honey. “He lives alone, watches the building like a hawk. If you ever need anything fixed, shout loud enough—he’ll hear.”
The movers began wrestling her sofa up the narrow stairs. Honey hurried to guide them, squeezing past Mrs. Park with an apologetic bow. Halfway up, one of the boxes split open, spilling a clatter of dishes. Mrs. Park gasped; Mr. Choi reappeared instantly as if summoned by chaos. Between the three of them they managed to gather the pieces—none broken.
Mrs. Park clucked her tongue. “First day luck. Better broken boxes than bones.”
Honey smiled. “I’ll take that as a blessing.”
The three of them headed up to the apartment after the movers. Mr. Choi placed the half-opened moving box on the kitchen counter.
“There’s a loose outlet here in the kitchen. I’ll have to tighten it later.”
Honey wasn’t even sure how Mr. Choi could tell from where they were standing, but she knew better than to challenge an expert.
She nodded. “Thank you so much.”
Mrs. Park ushered him out of the room and gave Honey’s arm a squeeze in reassurance. Honey said her goodbyes and was left standing in the doorway to her fresh start.
By late morning, the last of the furniture was inside. The movers bowed and left, promising to return for the empty boxes next week. Honey overlooked all the boxes that had been piled up. Normally, she would have tried organizing them as the movers brought them in but her run-ins with Mrs. Park and Mr. Choi had distracted her. Even so, she smiled, remembering their kindness. It was new, but certainly welcomed.
The apartment wasn’t fancy—standard cream walls, wooden floors polished unevenly, a balcony just wide enough for a chair and maybe a table if she was lucky—but it felt open, almost generous. Sunlight pooled on the floor like a welcome mat.
She turned toward the courtyard. Mrs. Park waved from her window; Mr. Choi was already bent over a toolbox near the mailboxes.
So this is Dawon Apartment, Honey thought. Maybe this time I’ll actually stay long enough to learn everyone’s names.
The apartment smelled faintly of wood polish and dust, the kind that carried stories instead of grime. Honey opened the balcony door and let in the outside — a slice of wind, the faraway chatter of children, the rhythmic thud of someone upstairs pounding dough or frustration into the table.
The room breathed.
She walked a slow circle around her new home, tracing her fingers along the edge of the kitchen counter, across the back of the sofa, over the uneven floorboards. After years of renting tiny boxes, the space felt like a luxury hotel suite. A small hallway led to a proper bedroom — one with a window, not just a slit of glass above the sink. Her bathroom even had a proper shower for once and wasn’t what they call a ‘wet room’.
She knelt to unroll her rug, pressing out the creases. “You made it,” she murmured, patting the fabric as if it were a friend who had survived the trip. And maybe it was; it’d been one of the few things she’d managed to keep through all her moves.
Then came the practical work: unpacking. It was honestly something she secretly enjoyed doing. She stacked dishes neatly in the cabinets, arranged spices on the counter, set her small espresso machine next to the window so it could catch the morning light. When she placed her books on the shelf, the wall seemed to sigh in relief.
By mid-afternoon, the apartment began to resemble her again — tidy, warm, dotted with tiny tokens of her life in Korea: a set of mismatched mugs collected from cafés, a tiny ceramic tiger from her students, a photo strip of her and her family back home.
She filled the kettle and waited for it to boil, the whistle echoing gently through the half-empty space. When the boxes were mostly emptied, Honey unzipped her teaching bag and began checking the folders inside. Monday would be her first day at Haneul Foreign Language Elementary, a contract position she’d taken after nearly 5 years of private academy work.
She flipped through the lesson plans she’d printed last week—color-coded post-its marking vocabulary games, reading tasks, and a few emergency fillers in case the kids finished early. A new school meant new coworkers, new routines, and another set of names to learn.
She stacked the folders neatly on her desk, next to a half-empty mug of coffee. Seven years in Korea, she thought. You’d think first days would stop feeling like first days.
Outside, the courtyard buzzed with late-afternoon life again. The sound steadied her. She reached for her planner and scribbled a note:
Buy markers. Print welcome worksheet. Don’t forget, smile.
From outside came the scratch of a broom — rhythmic, steady.
Curious, she leaned out the balcony. Below, Mrs. Park was sweeping the courtyard as if the entire world were her kitchen floor. Across from her, a little boy rode a small blue bike in wobbly circles while a woman — presumably his mother — called, “Dabin-ah, slow down!”
The boy didn’t slow down. He spotted Honey and braked suddenly, waving with both hands. “새 이웃이죠?” You’re the new neighbor?
Honey laughed. “응! 맞아.”
The woman looked up, embarrassed. “Sorry about him! He’s—”
“Friendly,” Honey said, smiling. “That’s okay.”
The woman smiled back, tucking loose hair behind her ear. “I’m Soojin. We’re in D-2.”
“Nice to meet you. I’m Honey. B-2.”
Soojin shaded her eyes. “If you ever need help, just knock. Everyone here talks more than they should, but they mean well.”
Honey glanced down at Dabin, who was circling the tree again, now singing something about dinosaurs. “Looks like it.”
“I’ll bring by some food later,” Soojin called before turning to chase after her son.
Honey stayed at the balcony rail a little longer, feeling the late-afternoon breeze sweep through the courtyard. A radio somewhere switched from music to a news broadcast. Doors opened and closed, a distant smell of frying garlic drifted from one of the lower floors.
The villa has its own rhythm, she thought. You just have to listen long enough to catch the beat.
Inside again, she took stock of her work — the books aligned, the sofa fluffed, the framed photo of her family resting on the sideboard. There was still one unopened box labeled Decorations / Maybe. She sliced the tape open and pulled out a tangled string of fairy lights, a framed print of a watercolor garden, and three small potted succulents.
She arranged the plants along the window sill and clipped the fairy lights around the curtain rod. When she switched them on, the room filled with soft gold. It made the evening feel like a secret waiting to be told.
Just as she sat down, a knock rattled the door.
“잠깐만요!” she called, wiping her hands on her jeans.
It was Mrs. Park again, holding a paper bag. “I told you I’d bring more bread. It’s best fresh.”
Honey took it with both hands. “You really don’t have to keep feeding me.”
Mrs. Park’s eyes twinkled. “That’s how we keep people from moving away. We feed them.”
They laughed together.
Before she left, Mrs. Park peeked inside Honey’s apartment, nodding approvingly. “Oh, bigger than it looks outside. You have good light.”
Honey welcomed Mrs. Park in to look around properly, feeling a sense of relief that the hard part was over. She placed the bag of bread on her freshly organized kitchen counter.
“That one—” Mrs. Park began, pointing toward the opposite building, “—that’s C-2. Belongs to a young man, quiet but polite. He always seems to be busy, but don’t wordy, he won’t bother you.”
Honey followed her gaze. C-2’s window was dark. Curtains drawn.
“I see.”
“He’s been away on business for awhile, but I’m sure he’ll be back soon. You can meet him then.”
Inexplicably, Honey felt curious about the man who lived in C-2. “Do you know what he does for work?”
“Oh heavens I’m not quite sure. Kyungho in D-1 would be the one to ask. He knows just about everyone’s business.”
Honey nodded along, her mind whirling with who any of these new neighbors of her could be.
Mrs. Park left with a cheerful wave, and Honey stood by the open door a moment longer, staring across the courtyard where the setting sun lit up the brick like embers.
She reheated the bread for dinner — simple, soft, sweet — and ate while scrolling through her phone. New messages blinked at the top of the screen.
Dawon Villa Residents 🏡 has added you to the chat.
Her first message appeared automatically: B2 Honey님이 들어왔습니다.
Almost instantly, replies flooded in.
BreadMom: Welcome, new neighbor!
MrFixIt: Don’t block the recycling bins.
CourierKing: I saw her earlier!
BalconyQueen: A foreigner? Yay!
B2 Honey: Hello everyone 🙂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BreadMom: If you need anything, knock on A-1!
JihoC2: — (away) —
Honey scrolled, grinning at the energy that jumped off the screen. BreadMom must be Mrs. Park, she guessed. MrFixIt… clearly Mr. Choi. CourierKing — maybe the delivery driver I saw earlier?
She opened her notes app, typing names quickly, just to keep them straight. Then she stopped mid-line.
Why not make this fun?
She opened her laptop instead. On a clean document, she typed a heading:
Villa Notes #1 – The Courtyard Chorus
Below it, she started a list:
- BreadMom – generous, possibly dangerous with carbohydrates.
- MrFixIt – local philosopher with wrench.
- BalconyQueen – mysterious, loves filters.
- CourierKing – apparently knows everyone’s secrets?
- Soojin & Dabin – sunshine incarnate.
- Jiho (C-2) – unknown entity.
She sat back and laughed softly at herself. “I sound like a detective with too much free time.”
But as she looked around the cozy apartment, boxes half-unpacked, lights glowing softly, she realized she didn’t mind.
It felt good to be curious again. She’d been wanting to start fresh this year, not only in this new neighborhood or even a new school but just in general. Even her blog needed a new update. Up till then, she’d been sharing teacher-related advice, what new cafes or activities she did, and even language learning tips. It was all well and good but almost…boring. Maybe this would get her excited to write again. Something to fill her evenings with after work.
The rest of the evening moved in domestic fragments — a shower, a loose ponytail, slippers scuffing the floor. She organized the kitchen drawers by habit, humming along to the sound of dishes settling into new places. The building’s thin walls carried faint echoes of other lives: a TV variety show next door, a baby crying two floors down, laughter somewhere far off.
For once, it didn’t make her feel lonely. It made her feel included.
When she stepped onto the balcony again, the sky was the color of deep tea. Streetlights blinked on one by one. Somewhere below, Mr. Choi locked the gate, twice she noted.
Honey leaned on the railing, listening to the hum of it all.
The night had folded itself gently around Dawon Villa. From somewhere on the first floor came the faint clatter of dishes being dried, the scrape of metal against porcelain, and the steady whistle of a kettle left a moment too long on the stove. A boy sprinted out of Building A, headphones on and a casualness to the way he walked. She watched him leave the courtyard and disappear down the street, already wondering where he was going or who he was.
Honey curled up on her sofa with her laptop balanced on her knees. The fairy lights reflected in the glass of her window, making the courtyard look dotted with tiny suns. Her half-written notes blinked on the screen.
She typed:
The woman downstairs sweeps the same patch of concrete nearly every free moment.
She deleted it. Typed again.
Maybe home is just the sound of people repeating the same small kindnesses until they start to echo.
She smiled at the thought, then saved the draft and pushed the laptop aside.
Outside, a light breeze stirred the laundry lines. The fairy lights across the way blinked, then steadied. A motorbike passed on the street beyond the gate; the engine noise faded into the murmur of the city.
Honey went to the balcony and rested her arms on the railing. Across from her, Building C stood quiet—rows of windows glowing like paper lanterns. Only one apartment remained dark: C-2.
She wondered about the man who lived there—the one marked away in the chat. Mrs. Park had called him quiet. That could mean anything. She imagined someone older, maybe a writer, someone who kept strange hours.
The sound of raindrops began to pitter patter on the roof. The forecast hadn’t called for rain but Honey imagined it was the metaphorical cleanse of her old life. It was blissful until a shriek and ran out into the courtyard. Clean laundry was being pulled off the line as the rain began to pick up it’s speed. Without a second though, Honey slipped on a pair of shoes and headed into the rain. Soojin was out there, frantically grabbing each piece of clothing off the line. Honey got straight to work until the two were under the shelter of Building D’s awning.
“Oh you didn’t have to help.” Soojin said, attempting to wipe some of the water off Honey’s damp pajamas.
Honey shook her head with a laugh. “Don’t worry. That’s what neighbors are for, right?”
As if suddenly reminded of something, Soojin smacked her forehead with her hand. “I meant to bring over a meal to you earlier and completely lost track of time.”
“Don’t worry about it. Mrs. Park came by with some bread earlier.”
“I’ll bring you something tomorrow, okay?”
Honey agreed and said her goodbyes before making her way back to Building B. As she stepped under the awning, a taxi stopped at the curb outside the gate.
A tall figure stepped out, suitcase in one hand, umbrella in the other. The streetlight caught his face for just a second—sharp jawline, black hair flattened from travel, expression unreadable. He entered the gate with the ease of someone returning to a place that hadn’t missed him.
Mr. Choi called from somewhere in the dark, “Back already?”
The man’s voice answered, low and polite. “Yes, sir. I got away earlier than expected.”
Honey froze, realizing she was watching openly. She made eye contact with him for just a moment. He gave her a short nod before heading into Building C. Honey made her way up to her apartment, feeling a wave of embarrassment. Out the window she could see a light on in C-2, spilled briefly onto the balcony, before going out again.
Honey stood there, silent, but looking at the darkened unit for just a moment longer.
So that’s him, she thought. The quiet neighbor.
Something about the timing made her laugh dryly under her breath. “You wait all day to meet someone and God waits until you’re in your pajamas out in the rain.”
She flicked off the fairy lights, and let the room fall into the same calm darkness as the one across the lane.
The courtyard settled into its nighttime hum—television laughter from A-3, the TV in the apartment upstairs, and the sound of rain falling to the ground.
Honey sat back down at her desk. The glow from her laptop painted her hands silver. She hesitated, fingers poised above the keys, listening.
If every building carried a song, Dawon Villa’s was a chorus sung off-beat but always together.
She began to type.
Villa Notes #1 — “The Courtyard Chorus”
Move-in day at Dawon Villa:
Twelve units, two facing buildings, one shared courtyard full of cracked pavement and potted plants that have seen better days.
I’m in a quaint unit with great sunlight and creaking floorboards. It’s perfect for a new start.
By the time the movers left, I’d already met three neighbors and it feels like half the villa had seen the inside of my living room.
Mrs. Park from Building A introduced herself first, armed with bread and unsolicited advice about the community handyman. She says she “keeps the peace,” which I’m beginning to believe translates to “knows everyone’s business.”
Soojin from Building D was with her son in the courtyard when we met. His laughter is like a ray of sunshine and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them better.
Ten minutes later my phone buzzed with a flood of emojis and helpful (and not-so-helpful) messages about recycling schedules, delivery boxes, and “beware of Mrs. Park’s midnight kimchi drops.”
They’re noisy, nosy, and strangely endearing.
Most of the day disappeared into unpacking—books first, then dishes, then deciding where the sofa should go (spoiler: I changed my mind three times). The apartment is bigger than my last one, which somehow makes it feel emptier. Still, it already smells like me: detergent, coffee, and new-curtain optimism.
I met our resident elusive neighbor at the worst possible moment. Face to face I stood in my pajamas in the rain as he came back from a business trip. I couldn’t have felt more embarrassed. Here’s to hoping that first impressions aren’t everything.
Tonight, the courtyard is calm as the rain plops on any surface it can find. I sat in front of the window for what felt like ages. The building creaks when the wind moves through it, and the sound almost feels like breathing.
Maybe that’s what I’ll write about here—this little corner of the city and the people who make it feel alive.
I don’t know them yet, but I want to.
Because sometimes the best way to find community is simply to start paying attention.
#movingday #villalife #newchapter
Comments:
@paperwindows: reading this with my morning coffee ☕ welcome home 💕
@walkslowly: this makes me miss my old apartment 😭
Anonymous: hope your neighbors stay as nice as they sound lol
Author’s Note
Thank you for stepping into Dawon Apartments — where every window hides a story. This first episode is a small introduction to the residents and the quiet charm of their everyday lives. I hope you’ll enjoy watching their stories unfold, one room at a time.
Read with: 10CM – “폰서트 (Phonecert)”
withlu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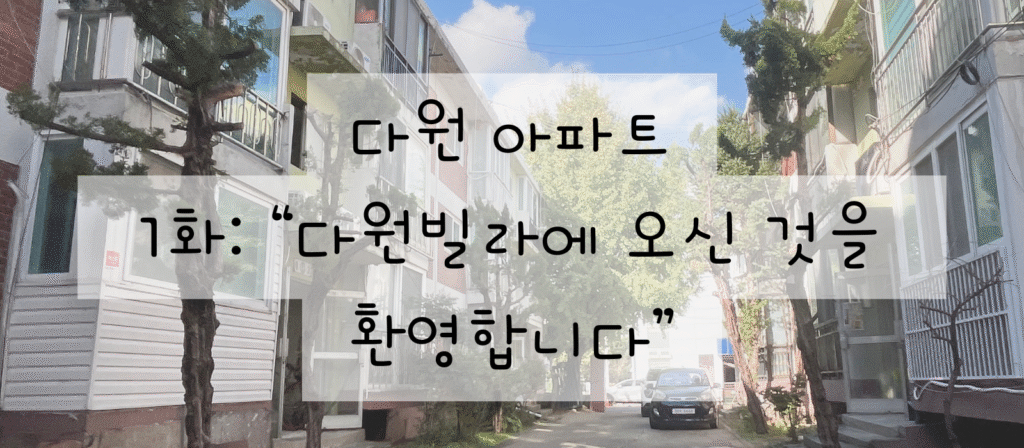
이삿짐 트럭이 좁은 골목을 덜커덩거리며 지나가더니 똑같이 생긴 벽돌 건물 두 채 사이에 멈춰 섰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부딪혀 다원아파트 마당의 갈라진 아스팔트 위로 금빛 네모들을 흩뿌렸다.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로 빨래줄이 흔들리고, 알록달록한 셔츠들이 마치 기도 깃발처럼 펄럭였다. 어딘가에선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열린 계단실로 멜로디가 스며들었다. 멀리선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고양이를 나무라는 소리도 어렴풋이 섞여 들렸다.
허니는 트럭에서 내려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다. 공기에는 이스트와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따뜻하고 익숙한 향. 한국에 온 지 7년 동안 셀 수 없이 이사를 다녔다—작디작은 오피스텔, 창문 하나 없는 원룸, 생각을 지워버릴 만큼 윙윙거리는 냉장고가 있던 쉐어 하우스까지. 그런데 이곳은 벌써부터 달랐다. 이곳에선 하늘이 보였다. 다른 건물의 회색 벽만 보이는 게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에 처음 이사 오던 날이 떠올랐다. 비가 오고, 혼자였고, 그때 집은 해리 포터의 ‘계단 밑 방’을 닮아 있었다. 따뜻함도, 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막 고향을 떠난 터라 그런 것들이 더욱 그리웠다. 그래서 지난 7년간 그녀는 자신만의 ‘꿈의 집’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애써 왔다.
어디선가 들려온 한국어 고함 소리에 허니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기사 아저씨가 기대 어린 표정으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허니가 물었다.
“어디로요?” 아저씨는 아마도 한 번 더 되물었다.
허니는 ‘B동 2층’이라고 적힌 계단을 가리켰다. “저기요. 이층이요.” 한국어는 매끄러웠다. 어딘지 모르게 외국인 특유의 리듬이 살짝 섞인 정도. 기사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자, 평소의 일상이 새것에 의해 흔들릴 때 늘 그렇듯, 이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먼저 커튼이 살짝 들리고, 이어 문이 삐걱 열렸다. 허니는 못 본 척했다. 동네마다 호기심이 사실상 ‘공용어’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여긴 벌써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허니는 미소 지었다. 좋은 신호야.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아담한 여인이었다. 손엔 하얀 가루가 살짝 묻은 둥근 빵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웰컴, 웰컴!” 밝게 웃는 눈. “저는 A동 1층 박선희예요. 박 여사라고 부르면 돼요. 이건 힘내라고 가져왔어요!”
허니가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냄새가 정말 좋아요.”
박 여사가 활짝 웃으며 빵 하나를 허니 손에 쥐여 주었다.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 생활은 얼마나?”
“거의 7년 됐어요.”
“아이구~ 그럼 거의 동네 토박이네.” 그녀는 행복한 듯 웃더니, 소곤소곤 덧붙였다. “근데 조심해요. B-1에 최 씨라고 있는데, 우리 자칭 보안요원이거든요. 쓰레기 분리 잘했는지 검문 나와요.”
허니는 달콤한 팥빵을 입에 문 채 웃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때, 남색 조끼를 입은 키 큰 노신사가 계단실에서 나타났다. 손엔 마치 팔의 연장처럼 보이는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
“박 여사, 새로 온 세입자 겁주지 마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어조엔 날이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허니를 보며 물었다. “B-2로 왔소?”
“네, 맞아요.”
“초인종 나중에 고쳐줄 테니 신경 꺼요. 괜히 두 번 울려.” 그는 툭,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퉁명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허니가 말했다. “저는 허니 하트예요.”
“최 씨요.” 그는 배달 차량이 길을 막는다는 투로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박 여사는 그의 등 뒤로 “봐요? 까칠한 척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하고 외치더니, 다시 허니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혼자 사는데, 매의 눈으로 건물을 지켜요. 뭐 고칠 일 있으면 크게 소리만 질러요—다 들려요.”
이삿짐 기사들이 좁은 계단으로 소파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허니는 서둘러 길을 안내하며, 박 여사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비집고 올라갔다. 중간쯤, 상자 하나가 터지며 그릇들이 덜그럭 쏟아졌다. 박 여사가 ‘앗!’ 하고 숨을 삼켰고, 최 씨는 마치 소란에 소환된 사람처럼 순식간에 다시 나타났다. 셋이 힘을 합쳐 흩어진 것을 주워 담았다—다행히 깨진 건 없었다.
박 여사가 혀를 찼다. “첫날 운 좋은 거예요. 상자가 깨진 게 낫지, 뼈가 깨지는 것보단.”
허니가 웃었다. “그 말, 축복으로 들을게요.”
셋은 이삿짐을 따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최 씨는 반쯤 열린 상자를 부엌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다.
“부엌 콘센트 하나 헐거워. 이따 조여줄게.”
어떻게 여기서 그걸 알아챈 건지 허니는 알 수 없었지만, 전문가를 도전(?)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해요.”
박 여사는 최 씨를 슬쩍 떠밀어 내보내고, 허니의 팔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인사를 나눈 뒤, 허니는 새 출발의 문턱에 혼자 서 있게 되었다.
늦은 아침이 되자 가구들이 모두 들어왔다. 기사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빈 박스는 다음 주에 가지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허니는 한곳에 쌓인 박스들을 훑어보았다. 평소 같으면 기사들이 들여올 때부터 정리했겠지만, 박 여사와 최 씨와의 만남에 정신이 팔려 그러질 못했다. 그래도 미소가 났다. 그들의 친절이 자꾸 떠올랐다. 낯설지만, 환영받는 기분이었다.
집은 화려하진 않았다—평범한 아이보리 벽, 울퉁불퉁 광이 난 나무 바닥, 의자 하나 놓으면 간신히 테이블도 둘까 말까 한 발코니. 그런데 이상하게 탁 트여 있었다. 후하게 느껴졌다. 햇살이 현관 매트처럼 바닥 위에 넓게 번졌다.
허니는 마당 쪽을 향해 섰다. 박 여사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고, 최 씨는 벌써 우편함 옆에서 공구 상자에 고개를 박고 있었다.
여기가 다원빌라구나, 허니는 생각했다. 이번엔 정말 이름을 다 외울 때까지 머무를 수 있을까.
집에는 약하게 나무 광택제와 먼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때가 아니라 이야기 냄새 같았다. 허니는 발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 한 조각,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 위층 어딘가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지 탕탕거리는 리듬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이 숨을 쉬었다.
허니는 새 집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손끝으로 부엌 조리대 모서리를 따라가고, 소파 등받이를 지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쓸었다. 오랫동안 작은 상자 같은 집들에서 살던 그녀에게 이 공간은 거의 호텔 스위트처럼 느껴졌다. 작은 복도를 지나 ‘제대로 된’ 침실이 있었다—싱크대 위 조그만 유리 틈이 아니라, 진짜 창이 달린 방. 욕실엔 간이 샤워부스가 아니라, 오랜만에 ‘젖는 화장실’이 아닌 ‘제대로 된’ 샤워 공간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러그를 펼쳤다. 손바닥으로 주름을 천천히 밀어냈다. “너도 잘 왔어.” 마치 길고 긴 여행을 견뎌낸 친구라도 되는 듯, 천을 토닥였다. 사실상 그럴지도 몰랐다. 수많은 이사 속에서도 끝까지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전—짐 풀기. 사실 그녀가 은근히 좋아하는 일. 접시는 가지런히 찬장에, 향신료는 조리대 위에,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은 아침 햇살을 받도록 창가에 뒀다. 책들을 선반에 꽂자, 벽이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만 같았다.
오후가 중턱을 넘길 무렵, 집은 다시 허니의 모습을 닮아갔다—단정하고, 따뜻하고, 한국 생활의 작은 증표들로 점점 채워졌다. 카페에서 하나씩 모은 제각각의 머그잔, 학생이 선물해 준 조그만 도자기 호랑이, 고향의 가족과 함께 찍은 포토부스 사진.
주전자를 채우고 끓기를 기다렸다. 휘파람 소리가 덜 비어 있는 공간을 부드럽게 울렸다. 박스가 거의 비자, 허니는 가방을 열어 교재 폴더들을 확인했다. 월요일은 하늘외국어초등학교에서의 첫 출근이었다. 사립 학원에서 5년 가까이 일한 뒤 맡게 된 계약직 자리였다.
지난주에 출력해 둔 수업안들을 넘겼다—색깔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둔 어휘 게임, 읽기 활동, 아이들이 일찍 끝냈을 때 쓰려고 준비한 비상 활동들. 새로운 학교는 새로운 동료, 새로운 루틴, 그리고 새로 외워야 할 이름들로 가득하다.
허니는 폴더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포갰다. 옆에는 반쯤 비어 있는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한국 생활 7년, 그녀는 생각했다. 근데 왜 첫날은 매번 ‘첫날’ 같을까.
밖에서 다시 마당의 오후가 살아났다. 그 소리가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플래너를 집어 들고 끄적였다.
마커 사기. 환영 워크시트 출력. 잊지 말기, 미소.
밖에선 빗자루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리듬감 있게, 꾸준히.
궁금해진 허니는 발코니로 몸을 내밀었다. 아래쪽에서 박 여사가 마당을 자기 부엌 바닥이라도 되는 듯 쓸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선 작은 파란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원을 그렸다. 그를 향해 아마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소리쳤다. “다빈아, 천천히!”
아이는 느리게 달리지 않았다. 대신 허니를 발견하자 급브레이크를 밟고 양손으로 크게 흔들었다. “새 이웃이죠?”
허니가 웃었다. “응! 맞아.”
여자가 허둥지둥 올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얘가—”
“친절하네요,” 허니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여자는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저는 수진이에요. D-2에 살아요.”
“반가워요. 저는 허니예요. B-2.”
수진은 눈을 가리며 위를 올려다봤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두드려요. 여기 사람들 말이 좀 많은 편인데, 마음은 다 착해요.”
허니는 공원 나무 주위를 빙빙 도는 다빈을 내려다봤다. 이번엔 공룡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 “벌써 그런 것 같네요.”
“이따가 반찬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은 말한 뒤, 자전거를 쫓아 다시 뛰어갔다.
허니는 잠시 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늦은 오후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딘가에선 음악이 뉴스로 바뀌었다. 문들이 열렸다 닫히고, 아래층 어디선가 마늘을 볶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빌라는 자기만의 박자가 있네, 그녀는 생각했다. 충분히 오래 귀 기울이면, 그 리듬을 잡을 수 있겠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그녀는 오늘 한 일을 훑어보았다—정돈된 책들, 푹신해진 소파, 사이드보드 위 가족 사진 액자. 아직 ‘장식/미정’이라고 적힌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테이프를 가르고 보니 엉킨 페어리라이트, 수채화 정원 프린트 액자, 작은 다육 화분 세 개가 나왔다.
창턱에 식물들을 일렬로 올려두고, 커튼봉에 페어리라이트를 감았다.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었다. 저녁이 마치 이제 막 털어놓으려는 비밀처럼 느껴졌다.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잠깐만요!” 허니가 청바지에 손을 쓱 닦으며 말했다.
역시 박 여사였다.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아까 더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빵은 갓 구웠을 때가 최고예요.”
허니는 두 손으로 정성껏 받았다.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먹여야 안 나가요.”
둘은 함께 웃었다.
돌아가기 전, 박 여사는 허니의 집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볼 때보다 넓네요. 채광이 참 좋아요.”
허니는 집안 구경을 권했다. 힘든 일과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정리한 부엌 조리대 위에 종이봉투를 내려놓았다.
“저 맞은편—” 박 여사가 반대편 건물을 가리켰다. “—거기가 C-2예요. 젊은 남자애 집. 조용하지만 예의는 바르고, 항상 바쁜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괜히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허니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C-2의 창은 어두웠다.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그렇군요.”
“요즘 출장 가 있던데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 만나보면 되죠.”
이상하게도 허니는 C-2에 사는 남자에 대해 호기심이 일었다. “무슨 일 하는 분인지 아세요?”
“세상에, 그건 잘 모르겠네. D-1 경호 씨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 일이라면 귀신같이 알아요.”
허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웃들에 대한 상상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환하게 손을 흔들며 돌아갔고, 허니는 한동안 문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벽돌 벽을 잿불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은 데운 빵으로 대신했다—단순하고, 부드럽고, 달콤했다. 핸드폰을 스르륵 넘기며 먹다 보니, 새 메시지가 상단에 반짝였다.
‘다원빌라 주민 🏡’ 채팅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첫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고 있었다: ‘B2 Honey님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답장이 쏟아졌다.
빵엄마: 새 이웃 어서 와요!
MrFixIt: 재활용함 앞 막지 마시오.
CourierKing: 아까 봤어요!
BalconyQueen: 외국인? 와우!
B2 허니: 안녕하세요 🙂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BreadMom: 필요한 거 있으면 A-1 두드려요!
지호C2: — (자리 비움) —
허니는 화면의 활기찬 에너지를 보며 씩 웃었다. BreadMom은 아마 박 여사겠지. MrFixIt… 분명 최 씨. CourierKing—아까 본 배달 기사님인가?
그녀는 황급히 메모 앱을 열어 이름들을 적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다.
그냥 재미있게 해볼까?
이번엔 노트북을 켰다. 새 문서에 제목을 적었다.
빌라 노트 #1 – 마당의 합창
그 아래에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빵엄마 – 너그럽다. 탄수화물로 유혹하는 위험인물일 수도.
MrFixIt – 스패너 든 동네 철학자.
BalconyQueen – 수수께끼. 필터 사랑꾼.
CourierKing – 아마 동네 비밀들을 다 아는 사람?
수진 & 다빈 – 햇살 그 자체.
지호(C-2) – 정체불명.
허니는 스스로 우습다는 듯 가만히 웃었다. “한가한 탐정 같네.”
하지만 반쯤 풀린 박스들, 은은한 조명 속 아늑한 집을 둘러보며, 그게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궁금해지는 기분, 오랜만이었다. 올해는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새 동네, 새 학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블로그도 새 바람이 필요했다. 그동안은 주로 교사 팁, 카페나 활동 후기, 언어 공부 팁 같은 걸 올려왔는데, 좋긴 해도 어딘가… 심심했다. 아마 이 이야기라면, 다시 쓰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채우는 무언가로.
그날 밤은 자잘한 집안일의 파편처럼 흘렀다—샤워, 느슨한 묶음머리, 슬리퍼 끌리는 소리. 습관처럼 서랍을 정리하며, 접시들이 새 자리를 찾아 ‘찰칵’ 소리를 냈다. 얇은 벽 너머로는 다른 삶들의 잔향이 묻어왔다: 옆집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 두 층 아래서 우는 아기, 어딘가에서 터지는 웃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포함된 느낌이었다.
다시 발코니로 나갔을 때, 하늘은 짙은 홍차색이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어딘가 아래에서 최 씨가 대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다. 두 번, 정확히.
허니는 난간에 팔을 걸치고 웅성거림을 들었다.
밤이 다원빌라를 살며시 감쌌다. 1층 어딘가에선 설거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도자기와 스치는 소리, 조금 오래 올려둔 주전자의 휘파람이 길게 울렸다. A동에서 한 소년이 헤드폰을 끼고 휙 뛰어나왔다. 아무렇지 않은 걸음걸이. 허니는 그가 마당을 나서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벌써 궁금해지면서.
허니는 소파에 몸을 말고 앉았다. 무릎 위엔 노트북. 창문 유리에 비친 페어리라이트가 마당을 작은 태양들로 뒤덮은 것처럼 보였다. 반쯤 쓰다만 메모가 화면에 반짝였다.
그녀는 타이핑했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같은 콘크리트 한 구석을 쓸어낸다.
지웠다. 다시 쳤다.
어쩌면 ‘집’이란, 사람들이 같은 작은 친절을 끝없이 반복해 소리가 겹쳐지는 곳인지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자, 저장을 누르고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었다.
밖에선 살랑 바람에 빨래줄이 흔들렸다. 맞은편의 페어리라이트가 깜빡였다가 다시 고르게 빛났다. 대문 밖 도로를 한 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엔진 소리는 도시의 중얼거림 속으로 스며들었다.
허니는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팔을 올렸다. 맞은편 C동은 조용했다—종이등처럼 켜진 창들. 단 하나만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C-2.
허니는 그 집의 남자를 떠올렸다—채팅방에 ‘자리 비움’으로 표시된 그. 박 여사는 그가 조용하다고 했다. 그 말은 사실 아무 뜻일 수도 있다. 허니는 문득, 조금 나이든 작가를 상상했다. 이상한 시간에 깨어 있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지붕 위로 ‘투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보엔 비가 없다더니, 마치 지난 삶을 씻어내려는 은유처럼 느껴졌다. 그 평온함도 잠시, 누군가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고, 허니는 뛰쳐나갔다. 비가 거세지며 빨래줄 위 옷들이 와르르 젖어들고 있었다. 허니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꿰어 신고 빗속으로 달려 나갔다. 수진이 허둥지둥 빨래를 걷어내는 중이었다. 허니는 말없이 손부터 보탰고, 둘은 D동 처마 밑으로 겨우 피신했다.
“어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진이 허니의 젖은 잠옷을 닦아 주려 손을 뻗었다.
허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이웃이죠, 뭐.”
그때 수진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마를 ‘탕’ 하고 쳤다. “아, 반찬 가져다 드리기로 했는데 깜빡했네요.”
“걱정 마세요. 아까 박 여사님이 빵 주고 가셨어요.”
“내일은 꼭 가져다 드릴게요, 네?”
허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나눈 뒤 B동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처마 밑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문 밖 길가에 택시 한 대가 멈췄다.
키 큰 남자가 내렸다. 한 손엔 캐리어, 다른 손엔 우산. 가로등 불빛이 잠깐 그의 얼굴을 비췄다—선이 또렷한 턱, 여행의 피로가 눌러놓은 듯한 검은 머리, 읽기 어려운 표정. 그는 이곳이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았더라도, 늘 그랬던 사람처럼 자연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왔어?”
낮고 예의 바른 대답이 돌아왔다. “네, 아저씨.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요.”
허니는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굳어 버렸다. 잠깐,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C동으로 들어갔다. 허니는 머쓱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끼며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C-2의 불이 잠깐 켜졌다가, 발코니까지 빛이 번지더니 이내 꺼졌다.
허니는 그대로 서서, 어두워진 그 집을 잠시 더 바라보았다.
아, 그 사람이구나. 조용한 이웃.
타이밍이 우스워서 허니는 마른웃음을 흘렸다. “온종일 기다려도, 정작 만나는 순간은 꼭 파자마 입고 빗속일 때네.”
그녀는 페어리라이트 스위치를 내리고, 맞은편과 똑같은 평온한 어둠 속으로 방을 맡겼다.
마당은 밤의 웅성거림으로 가라앉았다—A-3에서 새어 나오는 텔레비전 웃음소리, 위층의 TV 소리, 그리고 빗물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
허니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노트북 불빛이 그녀의 손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잠시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띄운 채, 귀를 기울였다.
만약 모든 건물이 제각기 노래를 갖고 있다면, 다원빌라의 노래는 박자가 조금씩 어긋나도 끝내 함께 맞춰 부르는 ‘합창’일 것이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빌라 노트 #1 — “마당의 합창”
다원빌라 이사 첫날:
양쪽으로 마주 보는 두 동, 총 열두 세대, 금이 간 바닥과 한때 더 푸르렀을 화분들, 그리고 하나의 마당.
나는 햇살이 잘 드는,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아담한 집에 들어왔다. 새 출발에 딱 맞다.
짐꾼들이 떠나기도 전에, 벌써 세 명의 이웃을 만났고, 빌라의 절반은 내 거실 구경을 한 것 같다.
A동의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빵과 함께 나타났다. ‘평화를 지킨다’고 소개했는데, 그 말은 아마 ‘동네 소식통’이라는 뜻일 거다.
D동 수진 씨와 아들 다빈이는 마당에서 만났다. 다빈이의 웃음은 햇살 같다. 꼭 친해지고 싶다.
그로부터 10분 뒤, 휴대폰은 이모지와 유용한(가끔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정보로 폭발했다. 재활용 요일, 택배 상자, 그리고 “박 여사의 자정 김치 급습에 주의” 같은 경고까지.
시끄럽고, 참견이 많고, 이상하게 정겹다.
하루의 대부분은 짐 푸는 데 녹아들었다—책부터, 그다음 접시, 그리고 소파 위치 정하기(스포: 세 번이나 바꿨다). 지난 집보다 넓어서인지, 순간적으로 더 비어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벌써 내 냄새가 난다: 세제, 커피, 새 커튼의 낙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가장 미스터리한 이웃을 마주쳤다. 파자마에 젖은 채 비를 맞으며, 출장에서 막 돌아온 그와 정면으로. 더 민망할 수 있었을까.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길.
지금, 빗방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 위로 빗소리가 톡톡 떨어진다.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치면 건물이 삐걱거리고, 그 소리는 거의 ‘숨소리’ 같다.
어쩌면 여기엔 이 이야기를 적을지도—도시의 작은 모서리, 그리고 그곳을 살아 있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난 아직 그들을 모른다. 하지만 알고 싶다.
왜냐하면 가끔 ‘공동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더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사날 #빌라라이프 #새로운장
댓글:
@paperwindows: 아침 커피랑 읽는 중 ☕ 집에 온 걸 환영해요 💕
@walkslowly: 이 글 보니까 예전 자취방이 그립다 😭
작가의 말
다원 아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모든 창문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번 첫 화에서는 주민들과 그들의 잔잔한 일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방 한 방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과정을 함께 즐겨주세요.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10CM – 〈폰서트〉
위드러브






